‘종’의 신분에 매인 성직자의 아픔이 영혼을 맑히는 시가 되다
‘시편’은 구약성경 가운데 신약성경에 가장 자주 인용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성도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동의보다 동감이 앞서는 피 끓는 고통과 번민의 강을 건너,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야 할 감사와 찬양이 아름답게 울려 퍼지기 때문일 것. <우리들의 시편>은 이 같은 구약의 시편을 모티브 삼아 기획되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삶이 녹록지 않기는 매한가지…… 힘겨운 삶은 어느 누구도 비켜 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정없이 흔들리는 인생의 갑판 위에 원망과 탄식을 토해 낼지언정, 신앙의 밧줄을 놓지 않고 결국 승리의 깃발을 꽂은 이들이 있다. 그들의 고뇌는 언어의 살갗을 뚫고, 그들의 환호는 페이지 여백에 골짜기를 낸다.
시리즈 세 번째 책 《6월이 지나가고 있다》는 여러 교회를 옮기며 오랫동안 이민 목회를 한 목사의 독백이다.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꿀떡 꿀떡 삼켜야 하는 설움, 그 누구도 대신 짊어져 줄 수 없는 고독이 시 바닥에 흐른다. 목사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 목사이기에 자진해 겪는 고통이 시 마디마디에 절여져 있다. 스스로를 시인이 아니라 생각하는 후배 목사에게 선배 목사는 시를 계속 쓰고 있는지 이따금 확인하곤 했다.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그의 기도 자체가 서정시”이기 때문이었다.
홍성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기독교 시집’ 시리즈
<우리들의 시편>은 아마추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저자의 날숨 그대로를 담았다. 그 문체는 자기만의 색깔로 강렬하다. 단어 하나, 자간 하나도 묵직하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언어가 진실된 표현을 넘어, 절망에 맞서 마침내 움켜쥔 승리와 희망의 발자취라는 점이다. 불의不意의 일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이, 가난‧오해‧불신‧시기‧무시‧수치가 난무하는 과녁 위를 걷고 있는 이에게 <우리들의 시편>은 실컷 울 수 있는 어깨를 내준다. 가만히 상처를 어루만져 준다. 어느덧 새살을 돋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부축해 준다. 칠흑 가운데 밝아오는 빛을 바라보게 한다. <우리들의 시편>은 예측지도, 예감치도 못했던 인생의 구덩이에 빠진 이들에게 우리 삶의 다양한 주제들로 더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다.
고통의 끝에서 피어나는 우리들의 노래
1. 그를 두고 오는 길
2. 내 동생 랑랑
3. 6월이 지나가고 있다
★<우리들의 시편>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책속에서
외로움
때로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앉아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는 얼굴 하나 없는
지나가는 사람들 보며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음을
몸으로 느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생각 없이 그곳에
머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떠나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고요가 소리 되어
말을 하는 그 자리에
잊혀진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마음 문 밖에서 노크를 합니다.
지나가는 얼굴들이
나를 만집니다.
비는 여전히
어둔 밤을 내리고 있습니다.
차례
1 신앙을 담다
말씀 묵상 14
묵상 1 16
묵상 2 18
기도하기 좋은 날 20
기도의 사람 22
마음걸이 24
새벽기도 26
용서 28
말씀 축제 30
설교 32
성공신화 34
주일 1 36
주일 2 38
수도修道 40
신년 0시 예배 42
성찬 44
2006 부활절 46
교구 종강의 밤 48
미안합니다 50
감사 52
병문안 1 54
병문안 2 56
참된 권위 58
양화진 비석 60
주님의 200불 62
만약 내게 64
침묵 1 66
침묵 2 68
침묵 3 70
침묵 4 72
침묵과 고독 74
2 가족을 담다
가족 78
미래 편지 80
미래 82
미혜 84
미선 86
부부 90
성탄절에 생긴 일 92
사랑은 신뢰입니다 94
엄마의 눈물 96
이사 1 98
이사 2 100
이사 3 102
이사 4 104
이사 5 106
이사 6 108
어머님 병상소고 1 110
어머님 병상소고 2 112
어머님 병상소고 3 114
어머님 병상소고 4 116
어머님 병상소고 5 118
어머님 병상소고 6 120
어머님 병상소고 7 122
어머님 병상소고 8 124
어머님 병상소고 9 126
아버지 128
3 인생을 담다
인생 132
졸업앨범 134
동기회보 136
바람 부는 날 138
6월이 지나가고 있다 140
집 142
열린 옷장 144
그릇 146
나눔 148
사랑 150
복된 사람 152
인생의 진리 154
겨울새가 나무 그네를 타고 있다 156
외로움 158
큰 바다 먼 바다 160
하루 여행 162
지은이의 말 165
추천글
25년 전, 갓 서른을 넘긴 청년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그의 기도는 서정시였고, 그의 설교는 서사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시를 쓰라고 권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평소에 이따금 시를 썼지만, 자신은 시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에는 영혼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목회할 때에도, 저는 그에게 시를 쓰고 있는지 몇 번이나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실제로 그의 시집을 대하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이기에,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눈물짓는 인생의 아픔과 질곡 속에서 갈리고 닦인 그의 꾸밈없는 시들은, 삭막하고 황량한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어루만져 주는 영혼의 시편이 될 것입니다. _이재철(100주년기념교회 목사)
저자
이동규
1958년생.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장로회신학대학원 졸업. 어린 시절 꿈은 파일럿이었다. 그런데 중학교에 입학해 안경을 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처음 인생의 절망이란 걸 느꼈다. 글쟁이, 슈퍼마켓 주인이라는 꿈을 거쳐, 평생 마음을 나누고 영혼을 만지고파 목사가 되었다. 용산교회, 주님의교회를 섬기고 뉴질랜드 오클랜드 주님의교회, 정원교회, 생명나무교회, 호주 체스우드윌로비 교회에서 15년간 이민목회를 했다. 지금은 100주년기념교회 전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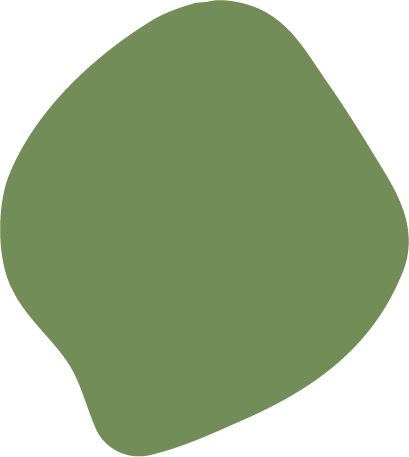
![[eBook]6월이 지나가고 있다](https://shop.hongsungsa.com/wp-content/uploads/2018/04/695-6월이지나가고있다.png)